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고생물학에 대한 격론에 불을 지핀 이후 약 1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고생물학이라는 과학적 분류를 떠나 다윈의 [종의 기원]은 당시 대단한 반향으로 수많은
논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과학은 수많은 관찰 기법과 추론
기법의 집합이고, 이론상 언제든 거짓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있는 명제들을 시험하는 데 그 모든
기법을 총동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과학이란 현재까지 발견된 또는 알려진 현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을 말할 때 시기적인 큰 변혁을 말하는데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뉴턴의 만유인력,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한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을 말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를 저자는 “지식의 진전은 바닥부터 벽돌을 쌓아 올려 천국까지 다다르는
탑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과 돌파구의 합작품이며, 기묘하고 우회적인 구조를 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위로 솟아오르는 구조물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으로 과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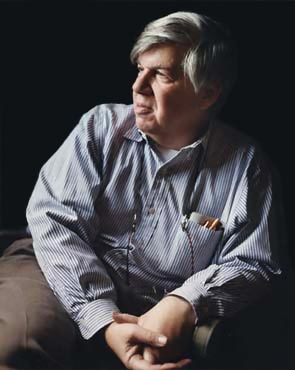
특히 지식의 전수를 통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인류에게 있어 과학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에도 과학의 발전을 단순히 단계별 발전으로 생각하기보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돌파구로 보는 관점은 새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전문분야가 고생물학임을
생각한다면 이같은 표현이 갖는 의미를 더욱 인류의 진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살필 때 고려해야
할 의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생물학자들은 진화적 변화에 관한 세 가지 대안 이론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하며
이는 획득형질의 유전, 돌연변이이론, 생물의 유전적, 발달적 프로그램들이 규정하는 제한된 길을
따라 진화가 펼쳐진다는 정향진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용불용설이나 정향진화론은 진화에서 있어 개체가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를 예상하여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진화란 “종들이 미래의 우연한 사건을 의식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으므로, 종들은
현재의 편익을 위해서만 진화하고, 미래의 운명은 행운의 바퀴에 맡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존자들이 득세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빙하기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는
생존 규칙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앙을 극복하게 해주는 속성들이 정상기에도
성공요인이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대멸종을 이겨내려면 특수한 의미의 행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역사는 점진적 진보와 확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격감과 제한적 생존의
이야기였다."라는 말로 우연에 따른 결과임을 주장하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지질학적 발견에 따른 연구와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아직까지도 미지의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한다. 따라서 과학을 대하는 태도로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증거와 발견을
통해 기존의 이론이 변경가능하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보도록 훈련된 대상만을 볼 수 있다. 대상의 종류를 바꾸어 관찰하려면 의식적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의식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배우기 > 讀後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읽고 부자되기!-'부자의 독서법'을 읽고 (5) | 2024.08.05 |
|---|---|
| 취향찾기 -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를 읽고 (0) | 2024.08.02 |
|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란 - '여덟마리 새끼 돼지'를 읽고 1 (0) | 2024.07.30 |
| 가치주의-'Money 2.0'을 읽고 (2) | 2024.07.29 |
| 코끼리냐, 벼룩이냐-'코끼리와 벼룩'을 읽고 (2) | 2024.07.26 |



